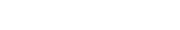.jpg)
소설이나 만화를 원작으로 만들어진 영화, 드라마 등은 보통 많이들 접해봤을 것이다. 그러나 책을 바탕으로 음악이 함께하는 연극을 만든다면? 원작을 다듬어서 연극으로 만드는 것까진 상상할 수 있지만 거기에 음악이 가미된다고 생각하니 어떤 결과물이 나올 지 예측이 힘들어진다. 최소한 지루하지는 않을 것 같은 좋은 예감!
이 공연은 아래의 두 책을 모티브로 만들어 진 공연이다.

사노요코 글, 그림 | 김난주 옮김
첫 번째 이야기. 백만번 산 고양이
세 사람이 무대 위에 등장하고 저마다 탬버린, 기타, 키보드 등 악기를 사용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듯 극을 이끌어 나간다. 세 사람이 공연하는 무대의 뒤편에는 책의 삽화가 스크린으로 비춰져 관객들의 이해를 돕는다. ‘백만번 산 고양이’라는 제목에 알맞게 이야기는 고양이가 백만번 죽고 살아나는 내용이다. 흥미로웠던 것은 이야기 중간 중간에 소품을 이용하여 극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바다를 항해하는 분위기를 연출할 때는 쏴아- 하는 파도 소리가 나는 악기를 흔들고, 극에 등장하는 흰 고양이를 묘사할 때는 흰 털이 부숭부숭하게 나 있는 천을 들고 연기하는 등 청각적인 요소와 시각적인 요소를 효과적으로 강조한 점이 마음에 들었다.
주인공인 고양이는 임금님의 고양이가 되기도, 뱃사공의 고양이가 되기도 하고, 서커스 단원의 고양이가 되기도 한다. 그 때마다 고양이는 물에 빠져 죽거나 서커스에서 마술을 시연하다 톱에 썰려(!)죽는 등 비극적인 죽음을 맞지만 정작 고양이는 주인들을 아주 싫어했고 어차피 다시 살아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죽음을 비관하기 보다는 단지 피식 하고 비웃는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의 표현이 익살스럽고 재미있어서인지 고양이의 죽음에 슬퍼지기 보다는 자꾸만 웃음이 나왔다. 음악 역시 극의 흐름에 따라 급격히 어둡고 밝아지기를 반복한다.
백만번이나 죽고 살아난 고양이는 어느 날 흰 고양이를 만나게 되었고 둘은 서로 사랑해서 고양이들을 낳고 가족이 된다. 흰 고양이는 늙은 고양이가 되어 마침내 움직임을 멈췄고 백만번이나 살았던 고양이는 그 곁에서 슬퍼하다가 죽었고 다시는 살아나지 않았다.
백만번이나 살고 죽기까지 고양이는 누군가의 소유물이었을 뿐 고양이는 주인들을 아주 싫어했다. 지난 삶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양이는 백만번이나 되는 세월동안 죽고 살기를 반복했던 것일까? 고양이가 다시 살아나지 않은 것은 비로소 정말 사랑하는 이를 만나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책 속의 고양이처럼 사람도 정말 행복하게 살기 전까지 백만번이고 다시 살아난다면 나는 이번 생에서 죽으면 다시 살게 될까, 아니면 다시는 살아나지 않을까?

아네스 드 레스트라드 글 | 발레리아 도캄포 그림 | 신윤경 옮김
두 번째 이야기. 낱말공장나라
두 번째 이야기는 참 신선했다. 사람들은 말을 할 수 없고 낱말 가게에서 낱말을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만 말을 뱉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공연이 음악이 주가 되는 공연이었다면 두 번째 공연은 기타연주와 함께 시각적인 면을 더욱 돋보이게 만든 극이다. 낱말이 주요한 요소가 되는 극이니만큼 자음들을 형상화해서 눈에 보이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낱말공장에서 낱말들을 기계들이 뽑아내는 장면을 연출한 것은 무척 재미있었다. 원작을 무대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각색하는 것도 어려웠을 텐데, 게다가 낱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작이라니! 어색하지 않게 잘 살려낸 것 같다.
극 중에서 낱말들은 낱말에 따라 비싼 낱말, 싼 낱말들이 있는 등 가격이 다르다. 그래서인지 부자들은 돈을 주고 낱말들을 잔뜩 사서 말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쓰레기통을 뒤져서 ‘숑’ 이라든지 ‘수수깡’ 같은 중요하지 않은 말들만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비싼 값을 치르고 낱말들을 구입한 부자들이 내뱉는 말이 막상 자기 아들 자랑, 딸 자랑을 위한 말에 지나지 않는 것이 우스웠다.
정말 낱말을 돈 주고 사야지만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말들을 하고 살게 될까? 아마 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말이나 누군가에게 감사하다거나 축하한다는 말을 하고 싶을 때 낱말을 찾을 것 같다. 누군가를 욕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돈까지 주면서 사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낱말을 사야만 말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함부로 내뱉는 말에 상처를 입는 사람들도 훨씬 적어질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극에 등장하는 주인공 필레아스는 시벨에게 사랑고백을 하기 위해 곤충망으로 멋진 낱말들을 모으려 노력한다. 하지만 결국 가진 낱말들은 ‘체리’, ‘의자’, ‘먼지’. 필레아스는 시벨에게 ‘사랑한다’, ‘결혼하자’라는 말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부자 친구 오스카를 생각하며 포기하려 하지만 이내 용기를 내고 진심을 담아서 체리, 의자, 먼지! 라고 필레아스에게 말한다. 낱말의 의미보다 마음이 먼저 통했는지 둘은 사랑을 이루게 된다. 말 자체가 담고 있는 낱말의 의미보다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우러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뜻한 느낌의 연극이었다!
[출처] 음악을 통해 책을 읽다 - 이야기꾼의 책공연|작성자 프린지